
오늘 출근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.
"나는 언제까지 이 회사를 다닐까?"
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손에 땀이 배기고,
커피를 들고 건물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,
늘 그런 생각이 스쳐간다.
‘나 진짜 여기에 아직도 다니고 있구나…’
딱히 큰 불만은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.
급여는 제때 들어오고, 사람들과도 큰 갈등은 없고,
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게 잘 다니는 직장인 중 하나다.
하지만 속은 다르다.
어쩌다 보니 다니게 된 회사에서 10년이 훌쩍 넘었고,
이젠 어디 다른 데로 가는 것도 버겁고 두려운 나이가 됐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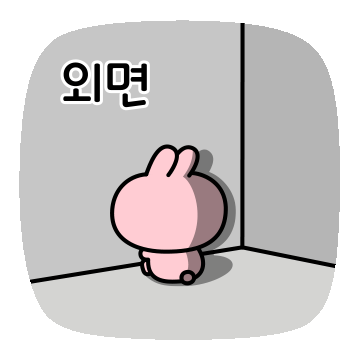
사회생활이 내 체질에 맞지 않는다는 걸
나는 처음 회사 다니던 그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.
점심시간에도 혼자 먹는 걸 좋아했고,
회의 때 말 한 마디 꺼내는 게 숨 막혔다.
그런 내가 "팀장님,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" 같은 말을 한다는 건
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.
그래서 늘 조용히 있었다.
말 없이 일만 했다.
조용히, 조용히, 그렇게 10년이 흘렀다.
퇴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늘 했다.
아니, "해야 한다"는 강박에 가까웠다.
하지만 매달 나오는 월급은,
내가 혼자 벌어야 하는 가정의 유일한 수입이었다.
아내는 전업주부다.
5년 차 부부지만 아직 아이는 없다.
가끔 아내가 묻는다.
“오빠, 요즘 힘들어 보여. 회사 괜찮아?”
“응, 그냥 그래. 원래 다 그런 거지 뭐.”
사실 괜찮지 않다.
내가 여기서 하루하루 버티는 건
가족 때문이고, 현실 때문이다.
하고 싶은 게 있다.
나는 언젠가 작은 온라인 사업을 해보고 싶었다.
이름도 없는 무언가라도 좋다.
"이건 내가 만들었다"고 말할 수 있는 무언가를.
그래서 책도 사고, 유튜브도 보고,
"소자본 창업"이니 "퇴사 후 생존 전략" 같은 영상도 밤마다 찾아봤다.
하지만 정작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.
오늘도 퇴근하면 또 누워서 넷플릭스만 켤지도 모른다.
그럴 때면 내 자신이 참 한심하고 나약하게 느껴진다.
"그냥 좀 더 버텨보자"는 말로 오늘을 넘기고,
"다음 달엔 진짜 뭔가 해보자"는 말로 시간을 유예한다.
그러다 어느덧 40대 초반이 됐고,
나는 여전히 회사의 부품처럼 앉아 있다.
이 글을 쓰는 지금도 잘 모르겠다.
나는 언제까지 이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.
아니, 나는 언제쯤 나를 위해 살 수 있을까.



